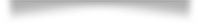예술과 삶을 하나로 한다는 것
그 전엔 몰랐었다. 그런 퇴폐적인 분위기를. 퇴폐라는 단어는 정말 그 발음과 생긴 모양까지 퇴폐적이지. 어릴 때 아빠가 the house of rising sun이 한 때 금지곡이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좋은 노래가 금지곡이란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땐, 나는 퇴폐라는 감정을 알 수 없었음이 분명했지만, 그 때는 그 어린시절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고, 나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바로 그 "퇴폐"라는 것을 확신했다. 자욱한 담배연기하며, 서넛씩 짝지어앉은 남녀들이 시시껄렁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야기들도 매우 진지하게 하는 듯하나 왠지 모를 그 될대로 되라는 분위기. 나뒹굴고 있는 맥주병과 메마른 노래들.
그렇게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가 내게 말하는 건 모두가 다 그랬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은 창녀의 프로근성이라고? 창녀와 프로근성이라는 생뚱맞은 연결도 그렇지만, 도대체 창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게다가 섹스는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일뿐이라고? 마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바나나껍질에 대한 이야기며, 말끝마다 따라나오는 아포리즘, 그리고 뭔가 "작업중"인 것이 있다는 말. 나는 그 모든게 조금은 싫고 조금은 두렵고, 한편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일면 별 것도 아닐거면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기도 했지만. 그 혹은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문득 마음 속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었다.
아쉬움의 정체는 욕심이었다. 나는 나의 지나친 건전함과 지나친 조심성이 어떤 일에 나를 영영 몰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가라든가, 하여간 그러한 예술가의 삶을 포기한지 오래였기 때문에, 왠지, 그는 정말 그럴듯한 예술가는 될 수 없을지라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하루를 살고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 미치도록 부러웠다.
나는 뭐라고요? 비록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든가, 오, 남녀간의 그러한 관계를 단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의 너무나 편한 변명거리일뿐이예요. 그런 경로를 제외하고도 우리들에게는 정신과 언어라는 소통의 수단이 있지 않아요? 바나나껍질을 말리고 찌고 말리고 또 어쩐다구요? 이미 중독이군요, 흠. 이라고 꼭 걸고넘어지곤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기 꿈을 위해 거금을 들여 장비를 장만하고, 새로 장만한 장비의 패브릭 가방만을 메고 나와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상한 순수가 그의 막사는, 혹은 막살아보이는 삶을 변호해주었고, 그래서 그는 내게 "위험하지만 싫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그가 그랬다. 바스키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이들은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내가 예술을 위해 삶을 버리지 못함을 속상해했었다.
하지만 이젠 알 것 같다. 예술을 위해 삶을 버려야만, 그렇게 매우 극단으로 치달아 뒹굴어야만 예술이 되고, 예술가의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고, 푼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골치아픈 일에 휘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문드문한 순간들이 예술이 되도록, 꿈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 것같다. 아이 아빠가 된 그가 생업과 상관없이 영화작업을 위해 고민하고, 매일같이 수학기호들과 아무생각없이 한바탕 씨름을 하는 내가 밤마다 라틴어 사전을 베고 잠드는 것은, 그가 부인과 자식을 팽개치고 입산수도를 하러간다든가, 내가 나의 책임을 버려두고 훌쩍 떠난다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어쩌면 더 아름답다. 나이먹은 그는 다른 아빠들이 그렇듯 아이를 사랑했고, 날씨가 추워 내복도 입는다고 말했고, 짠 것을 싫어하거나 겨울의 건조함을 싫어하는 나와 같은 장르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예술과 삶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삶을 예술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삶에 끌어내린다는 것이라는 걸, 난 이제야 알 것 같다.
일요일 아침,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내리는 희고 보드라운 눈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오랫만에 만나 덥석잡은 친구의 뜨거운 손과, 손톱 끝까지 피곤에 지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같은 것들이 예술이 아니라면, 그 어떤 찬란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없다.
- 5년 전, 나의 더없이 무구했던 시절에 알던 친구를 다시 만나고서.
-
삶을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린 사람은 거의 없죠..
-
이 글에 드러난 감수성과 함께라면, 으니님이 하시는 일거수 일투족 모두 예술일거 같아요.
그렇지만, 삶과 예술에 하이어라키는 없는 듯..^^* -
눈술 시험문제인줄 알았어요...전혜린이 생각났어요...으니님 글을 읽고...
내린 결론은 삶=예술 예술=삶...........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우리죠....알고보면 다 똑같은것인데...
진리는 평범속에 있다...천재는 그 평범을 깨닫는 사람이다....그런데 나는 그 평범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천재가 아니다....이런생각을 해봅니다.
-
추억.
-
'왕의남자'의 여운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
지난 날...
-
10년후에 400호...
-
안영미 내사랑.
-
콩순님아~ 나 분당간다여~
-
고정관념
-
지금 만나러갑니다.
-
제 새 앤 사진입니다.
-
오늘 차사고 났읍니다.
-
사막서 쇠사슬 감고 명상하다..
-
왕의 남자.
-
페이소스
-
[re] 페이소스
-
새해 복 많이!
-
호랑이
-
돌고래쑈
-
사슴
-
[18금?]물침대 몰카.....
-
세월이 가면
-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 계세요? ㅋㅋ
-
두뇌 크기와 지능 밀접하게 연관
-
메리 크리스마스 ㅡ.ㅡ;;
-
예술과 삶을 하나로 한다는 것
-
데쓰노트 패러디 - 마쯔다 구조편
-
박지성 첫골!!!!!
-
줄기세포(line) 원천기술(art?) 소유자명단.
-
Merry Christmas~♬
-
밀레니엄 베이비
-
[펌]월드컵 G조에서 제일 먼저 탈락할 국가......
-
FRIENGD의 사진입니다.
-
ipaco님과 np의 사진입니다.
-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
가을은 잘 갔겠지...
-
언제쯤 웃을 수 있는가???
-
.....하루
-
으니님, 넨네님~
-
세계를 감동시킨 사진...
-
언론과 진실.
-
[질문]용산 근처에 괜찮은 맛집 아시는 분..
-
청계산 고드름4
-
청계산 고드름3
-
청계산 고드름2
-
청계산 고드름1
-
가을과 겨울의 틈새에 서서...
-
디지털카메라 어떤제품으로 사야해여?
-
좋은 아침입니다^0^//
-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 정희성
-
반지 낀 무우~
-
배추값이 금값?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